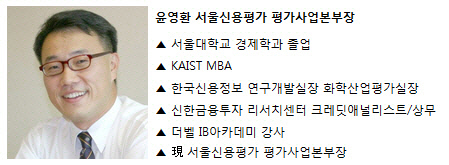이 기사는 2015년 05월 27일 10: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 신용등급 버블의 증거로 곧잘 글로벌 등급과의 격차가 거론된다. "미국에 가면 우리 기업들 대부분이 투기등급"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은 한국이지 미국이 아니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미국 투자자가 아니라 우리 투자자의 눈높이로 봐야 한다.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 국채시장과 달리 회사채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분리되어 있다. 투자자의 성격이 다른 만큼, 신용도에 대한 눈높이가 다른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언젠가 우리 회사채시장에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20~30%에 이르거나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재무활동이 훨씬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용등급 눈높이도 글로벌 수준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주식시장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버블은 특정 부분이 이상 성장하여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현상이다. 글로벌과의 등급 격차가 우리 회사채시장의 자원배분을 얼마나 어지럽혔고, 지난 신용위기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직 들은 바 없다.
정작 진짜 버블은 다른 곳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 회사채시장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이제 만성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증권회사들의 가파른 자산성장이 부쩍 관심을 끌고 있다. 고객부채인 ELS와 자기자본투자(PI)로 분류되는 투자유가증권이 동반 확장되고 있다. 우발채무인 채무보증도 급증해 20조 원에 이르렀고, 대표적 그림자금융인 ABCP의 미상환 잔액도 계속 증가하여 이제 110조 원을 넘어섰다.
급기야 당국이 정책적 대응을 고민하는 상황이 되었다.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은 한계에 부딪혔고, 당연히 그 근저에는 등급버블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관심은 온통 정책대응에만 쏠리고 있고 등급버블에 주목하는 이는 드물다. 하지만 등급버블의 정리 없는 정책대응은 그리 효과적이기 어렵다.
신용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엄청난 호황과 단기 고성장, 단기자금의 쏠림이 있어야 한다. 위기의 징후가 뚜렷해져도 당국이 절묘하게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내어' 위기를 비켜가거나 작은 소동에 그치는 경우가 더 많다.
진짜 위기는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이 실패하고, 이를 보완해야 할 당국과 신용평가사까지도 제 역할을 못할 때 닥친다. 미국의 칼럼리스트 로웬스타인(Roger Lowenstein)은 저서 '버블의 기원(원제; Origin of the crash, 2004년 출판)'에서 엔론 위기를 중심으로 이러한 과정을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다.
스타 기업들은 정보를 조작하거나 감추고, 애널리스트와의 접촉을 회피하고 때로는 노골적인 위협조차 서슴지 않는다. 시장은 숫자게임에 놀아나고, 회계규칙은 수많은 조정으로 요리책이 되었다. 시장의 규제체제는 통제자(Gatekeeper)에서 문지기(Doorman)로 변신했고, 연이은 규제완화로 당국의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되었다. 결국 거품이 한껏 부풀고 위기로 치달았다.
2002년 위기에 대한 분석이지만 2008년 위기에 대입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위기 이후의 뼈를 깎는 체질개선이 얼마나 쉽게 무력화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개혁이 벌써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도드-프랭크 법이 개정되어 대형 금융회사들의 파생상품 시장 복귀가 가능해졌다.
그래도 미국의 신용평가 개혁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다. 2015년 초에는 S&P에게 MBS 평가부실을 이유로 약 1.5조 원(13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제도적으로는 구조화금융 신용평가의 폐단을 막기 위해 동등 접근(Equal access) 조항을 도입하여 평가자료의 공유를 의무화했다.
미국 당국은 공인신용평가회사(NRSRO)도 7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 빅3의 위상은 여전히 절대적이지만 마이너 평가사의 점유율(등급 기준, 국채 제외)은 2007년 6%에서 2013년에는 12%로 갑절 확대되었다. 마이너의 약진에 빅3도 자세를 바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평가방법론의 변화다. 특히 캐피탈과 증권회사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뢰 민감형 자금조달(Confidence sensitive funding)'로 설명되는 변동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전면 개편되었다. 물론 환경과 리스크 변화에 대한 시장과의 충분한 교감(consensus)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금융회사 신용평가는 위기 이후 달라진 금융환경과 리스크를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 빈곤에 기인한 시장의 무관심과 금융회사에 대한 정책적 보호라는 묘한 기대가 가장 큰 장벽이다. 시장을 너무 앞서갈 수도 없는 평가사로서는 조심스럽게 문제인식의 일단을 피력해가는 상황이다.
'버블의 기원' 첫머리를 장식한 브래들리(Omar Bradley)의 메시지를 다시 새겨 읽어본다.
"스쳐 지나가는 배의 불빛이 아니라 별을 보고 항로를 결정하라."
|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윤승규 기아 부사장 "IRA 폐지, 아직 장담 어렵다"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셀카와 주먹인사로 화답, 현대차 첫 외국인 CEO 무뇨스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무뇨스 현대차 사장 "미국 투자, 정책 변화 상관없이 지속"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