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10월 15일 15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석채 회장이 KT 수장으로 취임한 이후 진행한 쿡(Qook), 올레(Olleh) 등의 TV 광고는 신드롬 수준의 대박이 났다. 장관을 역임한 관료가 민간 기업에서도 참신한 발상으로 혁신에 앞장서는 상징이다.
홍보면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전략이지만 이런 시도가 마케팅에는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지난해 31.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이동전화 KTF는 올 8월 31.3%를 기록해 점유율이 1년 새 0.2% 포인트 오히려 줄었다. 감소분은 경쟁사인 SK텔레콤이 고스란히 흡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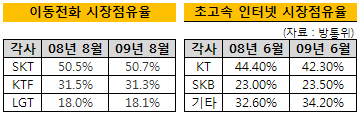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살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 KT는 같은 기간 2.1% 포인트의 점유율을 잃었고 감소분은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 등이 나눠 가졌다.
광고는 연타석 히트를 쳤지만 실적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통신업이 규제 산업인데다 이미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라 쉽사리 점유율을 늘리기 힘들 점이 분명히 있다. 판관비를 막대히 쏟아 부어도 출혈경쟁만 야기될 뿐이다.
최대 격전지인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의 아성(점유율 50%)은 무너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KT는 최근 3세대 영상통화 투자를 건너뛴 만년 3등인 LG텔레콤에도 쫓기는 모습이다. 10년 넘게 점유율 싸움을 벌여온 KT는 최근 홈 유무선통합(FMC) 서비스로 맞대응 카드로 내놓았다.
KT의 발표가 있자마자 SK텔레콤도 FMC 기반의 유무선 융합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며 경쟁을 선언했다.
과열된 통신시장의 전쟁은 자체적인 진화력을 잃어 정부 당국의 규제가 아니라면 법정에서라도 시비를 가릴 기세다. 실제 700억원대 소송도 벌어졌었다.
경쟁은 인수합병(M&A) 시장 같은 장외로도 번져있다. 이석채 회장이 취임하기 이전에 양측은 자산경쟁 확대에 대한 대립각을 첨예하게 세웠다.
KT는 SK가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나서자 주도면밀하게 독과점 이슈를 부각시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당국이 인수를 막진 않았지만 주파수 사용을 제한했다.
하지만 KT는 KTF 통합 시에 비슷한 논리로 역공을 당했다. 양사는 같은 목적지를 두고 뛰고 있지만 경쟁자 발목잡기에 더 관심이 많은 듯하다.
SK텔레콤이 지난해 미국 스프린트넥스텔 인수에 나섰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KT는 해외로 눈을 돌린 경쟁자에 질 수 없다는 이유로 투자은행 등을 통해 비슷한 매물 인수를 타진했다. SK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KT의 해외진출 욕구도 수그러들었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경쟁은 과열됐을 것이다.
최근에는 비주력 사업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SK가 하나금융지주와 손잡고 신용카드 사업에 나설 계획을 세우자 KT도 KT캐피탈을 앞세워 비씨카드 인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보고펀드가 먼저 비씨카드 지분의 상당부분을 선점하고 경영권 확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난데없이 KT 등장한 것이다.
전략적 투자자(SI)인 KT가 사업 시너지를 검증한 후 은행들 시각에서의 KT로의 매각 가능성에 대한 파악 후에 추진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사모펀드와 지분 경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KT는 최근 금호렌터카 인수전에도 뛰어들었다. 자회사 KT렌탈이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다지만 주력업을 벗어난 성장전략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일각에선 SK네트웍스가 금호렌터카에 관심을 보이자 견제를 위한 행동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유야 어찌 됐든 통신업과 당장 시너지가 없어도 SK가 하는 것이면 뭐든 좌시할 수 없다는 KT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자회사 합병을 통해 자산 규모 25조원 대의 거대기업이 된 KT가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할 때라는 시장의 지적이 강하다.
과연 KT가 부실한 자회사를 정리하는 한편 KT캐피탈, KT렌탈 등 성장성이 가능한 자회사를 통한 전략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청약증거금 2조 몰린 쎄크, 공모청약 흥행 '28일 상장'
- [영상/Red&Blue]겹경사 대한항공, 아쉬운 주가
- [i-point]모아라이프플러스, 충북대학교와 공동연구 협약 체결
- [i-point]폴라리스오피스, KT클라우드 ‘AI Foundry' 파트너로 참여
- [i-point]고영, 용인시와 지연역계 진로교육 업무협약
- [i-point]DS단석, 1분기 매출·영업이익 동반 성장
- [피스피스스튜디오 IPO]안정적 지배구조, 공모 부담요소 줄였다
- 한국은행, 관세 전쟁에 손발 묶였다…5월에 쏠리는 눈
- [보험사 CSM 점검]현대해상, 가정 변경 충격 속 뚜렷한 신계약 '질적 성과'
- [8대 카드사 지각변동]신한카드, 굳건한 비카드 강자…롯데·BC 성장세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