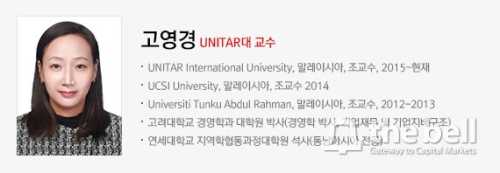다시 부는 국내 은행들의 동남아 바람 [고영경의 Frontier Markets View]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4일 06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이 올해 3월 미얀마 정부로부터 은행지점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았다. 지난 해에는 인도네시아 뱅크 메트로익스프레스도 인수했다. JB금융그룹은 캄보디어 프놈펜상업은행 인수를 확정짓고, 현지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 시중은행들의 동남아 진출이 다시 유행을 탈 조짐이다.
그런데 과연 한국 기업들에게 주요한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가 과연 금융 부분에서도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소위 개발도상국가 혹은 이머징마켓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가 바로 금융이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비슷한 소득수준의 다른 신흥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융분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국가들 수만큼이나 금융시스템의 발전 정도는 각기 다르다.
동남아 및 서남아시아 각국은 국내여신 비중이 높은, 전통적으로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를 갖고 있다. 즉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은행중심의 구조에서 해외은행 진입장벽은 매우 높다. 한국도 그러하듯 각국 정부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과 각종 규제 장치를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인허가 받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다음으로 금융시장이 발전한 말레이시아에는 아직도 한국계 은행지점이 단 한 곳도 없다. 우리은행이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지점을 개설하지 못하고 사무소 형태로만 근근히 유지하고 있다. 여러 원인을 거론할 수 있게지만,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일부러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서다. 방글라데시나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은 금융 부문 규정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다.
동남아시아 각국의 진입 장벽을 뚫고 활발하고 꾸준하게 시장을 확대하는데 성과를 내고 있는 은행을 꼽으라면 아마도 말레이시아계 은행들이 아닐까 싶다. 대표적으로 May bank, CIMB 은행이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May Bank는 20개국에 2400여 개의 지점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은행은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세 국가를 '홈 마켓'으로 생각한다. 전략적 목표는 아세안 지역내 선두은행이 되는 것이다.
CIMB 은행도 역시 아세안 내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주요주주 가운데 블랙록을 제외하면 2대 주주가 모두 말레이시아 연기금으로 전체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이 아세안 지역내에서 수위를 차지하도록 전략적 지원을 해왔다. 이 은행들은 투자은행, 보험, 자산운용, 이슬람 뱅킹, offshore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은행들의 진출 성과를 이익지표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May Bank의 경우 ROE가 2011년 14.1%에서 작년 11.1%까지 꾸준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일찌기 미얀마 시장에 공을 들인 덕분에 2015년 8월 미얀마 지점을 개설했고, 태국 금융시장에서의 영업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 작년에 출범함 아세안 경제공동체 덕분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데 이어, 향후 역내 거래 활성화 역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한국의 시중은행들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은 대부분 한국 기업체들과의 거래를 염두에 둔 동반 진출의 형태를 띤다. 수출입에 관련한 여신과 기업금융에 주력하며, 고객의 대부분이 한국 교민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한국계 은행들이 몰릴 수 밖에 없다.
지속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동남아시아 금융 시장이 단기간 내에 선진 시장 수준으로 도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상업은행 부문은 지역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향후 성장 전망도 밝은 편이다.
한국의 은행들이 이 지역에서 시장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말레이지아 은행들과 같은 동일 권역 내 강자들과 아울러 일찍이 진출한 일본계, 중국계 자본들과도 일전을 벌일 각오를 해야 한다. 이들 은행은 예대마진 영업에 익숙한 국내 은행들보다 유연하고, 문화적 이질감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리스크가 없는 시장은 없다. 직면한 시장을 외면할 것인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의 전력적 판단에 달려있다. 한국의 은행들이 과연 이 지역에서 가질 수 있는 경쟁우위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할 때다.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i-point]씨유메디칼 "AED 원격관리시스템 관심 확대"
- 거대 양당 연이어 은행장 소집…관세 후폭풍 대응 논의
- [보험사 CSM 점검]신한라이프, 신계약 성과로 극복한 부정적 예실차 효과
- [상호관세 후폭풍]RWA 조이는 금융지주, 비은행 반등 멀어지나
- [상호관세 후폭풍]금융지주, '환율 급등' 밸류업 프로그램 영향은
- [생명보험사는 지금]30년 넘게 이어진 빅3 체제, 깨질 수 있을까
- [금융지주 이사회 시스템 점검]'신설' 내부통제위, 감사위와 위원 중첩 못피했다
- [지방은행vs인뱅 구도 변화]확장성 제한적인 지방은행, 인뱅에서 돌파구 찾는다
- '빌리루빈 신약' 빌릭스, 급성신장손상 치료제 2상 추진
- [i-point]폴라리스오피스그룹, '밸류업' 주주 우대 서비스 시작